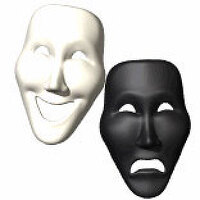카메라가 있는 조건하의 진실과 카메라가 없는 조건하의 진실
6mm카메라의 장점은 (Be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치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출연자들이 편안하고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물론 카메라를 인식한다. 슬쩍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하고, 미소를 지을 때도 살짝 어색하다. 그러나 이내 인터뷰 당하고 있는다는 것을 잊는다.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야 계속 걸리적거리겠지만, 속 깊은 이야기를 할 때나, 테잎을 반권 넘어 한권 씩 찍는 긴 인터뷰의 경우,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방송에 공개되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털어놓아, 찍는 사람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게한다.
특히 휴먼물의 경우, 그리하여 마치 카메라가 없는 듯이 찍는 태도가 중요하게 된다.
"그 PD, 참 잘 만들어"라는 평을 들을 때, 그 PD는 '주인공이 카메라의 존재를 잊고 자신을 쉽사리 풀어놓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과 같다.
출연자가 자신을 쉽사리 카메라 앞에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들이 동원된다.
제일 많이 쓰는 기술은 <친한 척 하기>일게다. 왜 <친해지기>가 아닌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늘 방송시간에 쫒기며 촬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밀도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친한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든 구워 삶아놓지 않으면 살가운 인터뷰하나, 속깊은 인터뷰 하나 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촬영을 해야할 때 나는 곤혹스럽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대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럴 때는 <시청자를 위해서는 알랑방구라도 뀌어야> 한다는 이 바닥의 오랜 미덕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찍어야 한다.
<친한 척 하기>가 잘 안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큐멘터리 PD 해먹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사람들에게 쓰는 기술은 <나도 하나 까기>기술이다. 그의 진심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그러나 그가 카메라 앞에서 망설일 때 이 기술을 쓴다. 방법은 간단하다. 촬영하는 나 자신도 이야기해서 별로 득될 것 없는 쪽팔렸던 경험이나 속내를 이야기 하는거다. 이 때 요령은 그 쪽팔림이 적절한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충 십원짜리로 뭉개려다가는 역효과가 난다. 무릎 꿇을 때는 확실하게 무릎 꿇어야 한다. 그리고 타이밍을 잘 포착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면서 적당히 윽박지르기도 했다가 맞장구를 치기고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적인 질문을 쏘아붙여야한다. 당신의 쪽팔림은 뭔가? 하고.
하여간 출연자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이게 하는 일은 다큐멘터리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하지만 그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있는 카메라를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양자의 세계에서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알 수 없고, 다만 확률적으로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관찰자 때문이라고 한다. 뉴튼적 공간에서는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양자의 영역에서는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의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객관과 주관의 구분은 없어지고 상호작용만이 남는다.
다큐멘터리가 추구하는 <진실>은 소위 객관의 검증을 요구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애초에 객관과 주관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면 진실은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것인가? 오히려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상황에서의 프리젠테이션, 상호작용 속에서의 유추에 의한 진실의 추적이 훨씬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다큐멘터리의 1인칭 시점으로의 이동이나 주관적 내레이션의 활발한 시도 등도 이해할 만한 현상이다.
1인칭의 프로그램. 그게 필요하다.